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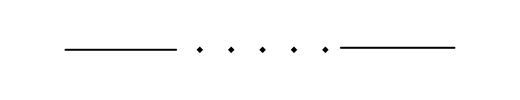

버섯곰팡이씨
파이널판타지14: 오르슈팡×리베리우스
*창천의 이슈가르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했을 터였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을 시간이었다.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했던 행동, 당신이 서 있던 장소. 그 모든 것이 기억 속과는 어긋나선 안 되었다. …아니, 어찌 보면 지독히도 반복된 수레바퀴 속 익숙해져서 오히려 틀에 박혀버린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이곳에 없어야 할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눈을 몇 번 깜박였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 손을 몇 번 꼽아가며 제가 밟아온 전철을 돌이켜보고, 제 볼을 한 번 쭉, 잡아당겨도 보고 심지어는 제 앞에 있는 상대방의 손을 꾹, 잡아도 보았다. 그런다고 해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훅 사라질 일은 없었다. 한가득 당혹스러운 것은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어이없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 보였다. 서로 눈만 끔벅이다, 곧 거의 동시에 직감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눈치를 대강 챘다. 아, 그렇구나.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오르슈팡경, 설마하니….
-맹우여, 자네도인가.
순식간에 짧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된 눈빛교환을 끝낸 둘은 동시에 탄식에 가까운 숨을 내뱉었다. 오, 하이델린이시여.
*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간의 규칙성을 벗어난 뜻밖의 상황에 두 기사는 머리를 맞대었다. 허나 한 쪽은 천생 검만 다뤄왔던 기사요, 다른 한 쪽도 창을 오랫동안 잡아온 용기사였다. 마법학적인 것보다는 무예에 통달한 자들인데 어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주변에 도움을 청해본다는 선택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들이 특정한 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기현상을 설명할 자신도 없거니와, 그나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새벽의 혈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거기다 어찌어찌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이곳에 있는 두 기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굴레 속 처음으로 마주친 서로의 이레귤러였다. 첫 번째 이레귤러이자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서로 또 다시 마주할지조차 불투명한 이레귤러들이었다. 서로의 존재를 기억한 채로 마주칠 수 있다고 해도, 주변은 처음으로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결국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셈이었다. 결국 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단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답을 내야만 하는 처지였다.
한참의 고민 끝에 은빛 검날 포르탕 가 기사와 푸른 용기사가 선택한 것은 참으로 간단한 것이었다. 커르다스 용머리 전진기지에서 핫초코와 함께하는 짧은 티타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지만 결국은 해결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기현상에 대해 탐구하기를 포기하는 걸 먼저 제안한 것은 푸른 용기사, 리베리우스 쪽이었다.
"후아… 역시 오르슈팡 경의 핫초코는, 언제 마셔도 따스하다니까요."
이 핫초코, 정말 그리웠어요. 리베리우스는 웃음을 지으며 오르슈팡을 바라보았다. 맞은편에 앉은 오르슈팡은 다행이라는 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래서 맹우여, 자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경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경과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과정은 비슷해도, 결과는 차이가 있단 건 정말 뜻밖이었지만…."
교황청 진입작전까지는 분명 과정은 비슷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오르슈팡에겐 리베리우스의 죽음이, 리베리우스에겐 오르슈팡의 죽음이. 서로의 죽음을 몇번이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봐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축은 누구의 시간축일까. 이 티타임엔 굳이 그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을 휴식시간을 괴롭게 보낼 이유는 없었으므로. 두런두런, 두 기사는 이야기꽃을 한참을 피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를, 속에 고인 말을 한참을 쏟아내었다.
"그럼 이번에도 서로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겠군."
"…그렇겠죠? 그렇지만 의외였어요. 어느 세계에선 경도 시간을 반복하고 있었을 줄은."
"맹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기꺼이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경이 그러하듯, 저 역시 경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그러고 싶었어요."
리베리우스의 말은 의외였다는 듯, 오르슈팡의 입은 일순 멈추었다. 곧 눈웃음을 가득 지어보였다. 그게 자네의 선택이라면 마땅히 응원하겠네. 그것을 끝으로 말은 끊어졌다.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커르다스를 수호할 은빛 검날은 빛의 영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걸고 있었고 에오르제아를 수호할 빛의 영웅은 은빛 검날을 구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미 침묵 속에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티타임은 밤새도록 한참 이어졌다.
*
오르슈팡과 리베리우스는 사실 직감하고 있었다. 서로의 이레귤러를 만난 시점부터 둘 중 어느 누군가의 반복은 반드시 끊길 것임을. 당연했다. 살아남아서 반복될 과거를 맞이할 사람이 드디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었으므로. 두 기사는 이후 익숙한 절차대로 교황청으로 진입할 시간을 기다리며 빠르게 눈빛을 교환했다.
한 명의 포르탕 가 기사가 다시 과거의 아침을 맞이할까.
한 명의 빛의 영웅이 다시 과거의 아침을 맞이할까.
혹은, 어느 쪽이든 이 지독한 반복은 종말을 맞이할까.
그것은 이들의 시간선을 꼬아버린 하이델린님만 아시겠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의 시간선을 끊어버릴 칼날을 들었다.
뎅겅.
하나의 시간은 기어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누군가의 과거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BACK
